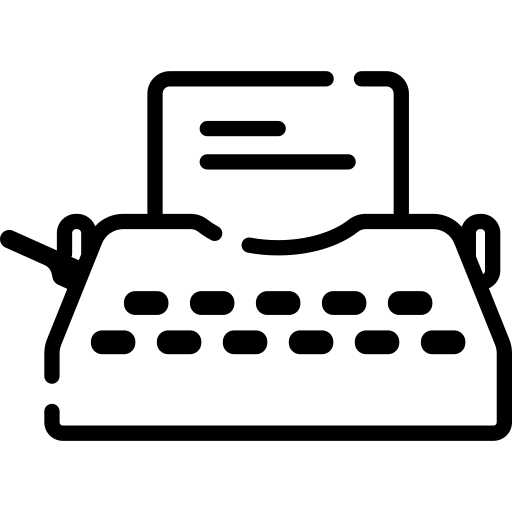가끔, 아니 자주 글자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갈하게 쓰이고 있는 글자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닌, 그것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단어와 이어 만들어 내려는 문장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끼곤 한다.
살아있는 문장들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시간의 순서를 흩뜨린다. 간밤. 새벽. 세시. 어떠한 이유에서 잠에서 깼는지 모르겠다. 한참을 뒤척이다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다가 한강 <흰>을 읽었다. 그들이 건네는 새로운 시간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엎드려 책을 보고 있는 방 안의 나를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으로 데려갔다.
몇 년 전 나는 뉴질랜드의 깊은 산속, 한 헛(hut)에서 홀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다. 강물에 젖은 신발을 벽난로 앞에서 말리며 말이다. 자전거 여행이 한 달 차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였을 것이다. 짙은 어둠이 광활한 산맥과 그곳을 빽빽하게 메운 나무에 둘러싸여 한기를 더해 내리던 그 밤. 간밤의 장대비로 불어 넘칠 듯 거세게 휘몰아쳐가던 어느 이름 모를 강가 옆의 작은 헛에서 하루를 보낼 셈이었다. 낯선 공간과 시간에 대해 날이 선 긴장감으로 잠을 설치던 그 밤. 내게 온기를 선사해준 건 누군가 패다 놓은 습기 먹은 장작과 작은 책장에 널브러져 있던 여행 잡지, 빛바랜 신문지들이었다. 나는 신문지에 불을 붙여 가지런히 쌓은 장작을 태우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불을 피우고서는, 사파리를 주제로 한 잡지에서 사슴 머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소녀의 인터뷰를 읽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아침. 장작은 모두 타버렸고, 머리 끝까지 추켜올린 침낭 밖으로 두 뺨을 내밀자 기다리고 있던 한기가 밀려들어왔다. 작은 창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통해 이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이 모두 지나고, 익숙한 아침의 시간이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낯설면서도 두렵고, 또 이내 익숙함과 맞물려 추억이 되었던 시간들.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작은 불빛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몸 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펜의 그림자를 수평으로 이어가며, 흩어지는 하루의 생각과 감정, 사건들을 붙잡아두곤 했다. 어둠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하여. 빛나지 않았던 하루와 그로 인한 노곤함이 만족스러웠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오래 기억하기 위하여.
이 새벽, 나는 또다시 가늠하여 본다. 이 밤이 지나고 난 아침, 또다시 내가 살아낼 아직 오지 않은 미지와 무지로 가득한, 낯설고도 새로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또 다시 익숙해질 이에 둘러싸인 슬프고도 아름다운 것들을.
'기록 > 일상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부의 마음으로 ⏐ 일상 에세이 ⏐ 43 (0) | 2021.07.13 |
|---|---|
| 러닝 ⏐ 일상 에세이 ⏐ 41 (0) | 2021.06.02 |
| 젠더 갈등이라는 것에 대한 짧은 생각 ⏐ 일상 에세이 ⏐ 40 (0) | 2021.06.02 |